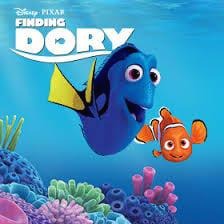티스토리 뷰
통계 수치를 해석해본 내용
①여성 가구주 비율에서 유배우 구성비가 점점 증가하는데, 2040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것도 인상적. 이것은 여성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상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남성들의 고용불안이 심해지면서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가구주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것은 남성부양자모델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할 훌륭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이 45~49세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저임금 고강도 노동 일자리로 '경력단절' 여성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관측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②여성 국회의원 및 장관 비율 2페이지의 두 그래프에서 가로축(연도)가 서로 맞지 않는데 맞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여성 장관은 처음으로 탄생한 지 채 15년도 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③일생활균형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시간이 취업 여성의 그것보다 38분이나 많다는 데서 앞에서 말한 남성부양자모델의 비합리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가사시간 감소 폭이 너무 적은 것도 눈여겨볼 지점.
④성폭력, 가정폭력, 불법촬영 검거 인원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성폭력 신고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검거율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나치게 희망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⑤고용 및 소득 제발 이런 데 '남녀' 같은 표현 안 쓰면 안 되나? '성별간' 이라고 해도 되잖아. 아무튼 월평균 근로시간 차이와 소득 차이를 대비해서 '일을 적게 하니까 돈을 적게 버는 것뿐,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박을 해보고 싶음. 여성 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10년 간 11.8%p 상승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여성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대로 증가했다는 점, 여성 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해소 폭보다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수준의 증가 폭이 한참 적다는 점(8.3%p)에 눈길이 간다.
⑥건강 기대수명 격차가 줄어들고, 여성의 기대수명에 연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반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 중이라는 점에 눈길이 간다. 또, 건강수명의 증감폭이 크지 않고 1세 내외에서 유지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건강수명이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이 우려된다. 이건 2018년 여성의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10년 전에 비해 각각 0.1%p, 2.2%p 증가한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일단 오늘은 여기(5페이지)까지.
'공부 > Data Scie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Object Detection: YOLO(1) (0) | 2022.02.10 |
|---|---|
| 28회 ADsP: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준전문가에 합격했다! (0) | 2021.04.09 |
| R Computing DAY 2: 데이터의 입력과 저장 (0) | 2021.04.01 |
| 20210127~0128 오늘공부: MovieLens 영화평점 데이터 예제 (0) | 2021.01.29 |
| 20210104 오늘공부: '2020 데이터 시각화로 보는 여성의 삶' (1) (0) | 2021.01.05 |
- Total
- Today
- Yesterday
- 데이터분석
- github
- ADsP
- 빅데이터
- todayIlearned
- 빅분기
- 취업준비
- Notion2Tistory
- 이자포스터디
- 커리어코칭
- 개발자포트폴리오
- data annotation
- Til
- 데이터과학
- 빅분기후기
- 코테공부
- googlecolab
- 이력서
- 빅분기합격
- 깃허브
- 빅데이터분석기사
- 코드스테이츠
- 데이터준전문가합격후기
- Kaggle
- 자격증
- 인공지능
- ADsP합격후기
- ai부트캠프
- 데이터준전문가
- 자버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